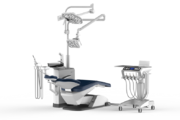아침에 출근해 옷을 갈아입는데 벽에 무엇인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말벌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모양이다. 병원 창문을 열어두면 많은 동물이 날아들어 온다. 여름밤이면 하루살이들이 불빛을 보고 날아들어 문 열기가 어렵다. 이따금 새도 들어온다. 참새, 비둘기, 이름 모를 새도 있었다. 한 번은 몇 시간을 나가지 못해 119를 부른 적도 있었다. 그중에 가장 불청객이 말벌이다. 방충제를 준비하고 파리채로 한방에 잡아야 했다. 놓치고 날아다니면 직원이나 환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꿀벌이라면 죽이지 않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라는 필자의 말에 한 직원이 “뭐가 다른데요?”라고 반문했다. “많이 다르지요”라고 답하고 꿀벌과 말벌의 차이와 방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독침 모양이다. 꿀벌은 갈고리 모양이라서 침을 쏘면 뺄 수가 없고 침과 내장이 연결돼있어서 빼는 순간 죽는다. 반면 말벌은 바늘 모양으로 반복해 찌르는 것이 가능하다. 꿀벌은 목숨을 걸고 찔러야 하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반면 말벌은 공격성이 강하다. 물론 먹이도 다르다. 꿀벌은 새끼들에게 꽃가루를 공급하지만 말벌은 벌레를 공급해준다. 종종 보이는 꿀벌 다리 쪽이나 배 쪽에 노란색으로 볼록한 것이 새끼에게 먹일 꽃가루를 모아놓은 것이다. 말벌은 이런 이유로 필자에게 일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말벌 입장에서는 필자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이 그저 벽에 붙어 있었을 뿐이라고 억울해서 항변할 수 있을 법하다.
이런 차이를 동양학에서 성(性)이라하였다. 원천적으로 타고 나는 성질을 성이라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용어도 이런 의미이다. 장미와 국화가 다른 꽃을 피우는 것도 성(性)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이란 다를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이유로 차이를 만든다. 남성·여성이란 용어는 다른 성질인 것을 의미하고, 남자·여자란 용어는 대응관계를 의미한다. 내적인 성(性)은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음에 나타나면 심성이고, 물건에 나타나면 품성이다.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면 성향이고, 패턴을 지니면 성격이다. 공자가 추구한 최고 경지가 성(性)이다. 인간이 가장 원천적인 마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길)을 도교에서 도(道)라 하였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표현하였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성(性)을 Sex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영어 Sex를 성(性)으로 번역하면서 생긴 문제인 듯하다. 아주 작은 의미에서 맞는 해석이지만, 동양학에서 성(性)이 지닌 의미에는 못 미치는 안타까움이 있다. 과거 서당에서 유학의 가장 기본 개념인 성(性)를 가르치며, 제일 처음 성품과 심성을 교육하였다. 성에 이르기 위한 가르침이 유교이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유생이며, 그 방법을 경(敬)이라 하였다. 요즘 도(道)라 하면 마치 도술을 부리거나 무슨 부적이나 쓰는 그런 뉘앙스지만 원래는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하였다. 존경(尊敬)이란 단어도 타인을 존중하는 수행 방법이었다.
학교교육이 현대화되면서 마음과 수행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었고, 조선 500년을 지탱해온 학문과 도덕의 기본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 잔존된 용어마저 성(性)처럼 의미가 변했다. 의미가 변한 것보다는 축소되었다. 현대인에게 심성과 성품의 가치가 축소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넓은 의미인 성(性)의 개념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불교에서는 여여(如如)라 하였다. 그것을 완성하면 성(聖)이다. 유교는 노력하여 이루는 단계적 개념이고, 불교는 있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개념차일 뿐이다. 그래서 깨달은 자를 성인(聖人) 혹은 성자(聖子)라 한다.
현대에 성인이 적은 것도 원천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탓이다. 요즘 사회가 상식과 멀어지고, 혼란스럽고,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가짜뉴스가 판치고, 사이비가 극성에 달하고, 범죄가 극단에 이르는 모든 이유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마음에 대한 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는 행동을 지배하는 심성을 맨 처음 가르쳤다. 우리는 참 현명한 선조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