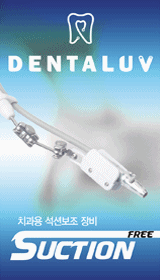지난해 4월 법원이 의료제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12월,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되 내국인 진료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당연히 녹지병원은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법원이 의료제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12월,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되 내국인 진료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당연히 녹지병원은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다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누군가 예측한 ‘의료민영화 11단계 미래도’가 현실화되는 듯하다. 미래도에서는 1단계를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하고, 2단계가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한 것이라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다’고 돼 있다.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금기시 돼왔던 의료영리화, 민영화라는 단어를 다시금 사회로 소환했다.
법원이 의료민영화에 물꼬를 터줬다면,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한 것은 행정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언급했다.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대표적인 사상가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경제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시장 확대, 그리고 민영화를 정책수단으로 자유를 확대한다는 경제이론이다.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 내놓은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공공성 강화로 비치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대신 민간병원에 공적자금을 투여해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민간영역의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많은 우려 속에서 경제관료 출신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취임 이후 몇 달 동안 의료민영화로 의심되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공공기관운영회의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10월에는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 만성질환에 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전 정부에서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비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작은 정부, 자유시장, 민간영역 확대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관되게 투영돼 있다.
의료민영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어떠한 사회적 결말을 가지는지는 잘 알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미국의료 현실은 의료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는 괴담 수준이다. 민영화는 괴담을 현실화시킨다. 민영화는 의료인 입장에서도 비극일 수밖에 없다.
현재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민영화를 반기는 의료인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더욱더 치열해지는 경쟁, 의료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 앞에서 느끼는 의사로서의 자괴감, 보험회사 앞에 철저히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상실감, 민영화 그 어디에도 의료체계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의료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영리병원 도입과 내국인환자진료 제한해제, 그에 따른 당연지정 폐지와 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제 무력화로 이어지는 민영화 수순 앞에 의료인으로 가져야 할 사명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민간영역으로의 전환은 모두에게 불행하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