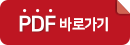잃어버린 낙원이란 의미의 ‘실락원’은 영국의 시인 존 밀튼이 17세기에 지은 서사시로 영어 원제는 Paradise Lost이다. 존 밀턴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혁명에 실패하여 파산하고 실명하였을 때, 인간의 원천적인 선악의 문제와 자유의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원죄를 내용으로 이 책을 썼다. 존 밀턴은 셰익스피어에 이어 2인자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는 대단한 문호이며 ‘실락원’ 또한 단테의 신곡에 버금가는 명작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97년 유학생이던 필자가 레지던트 2년차 때, 일본에서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보며 대히트 했던 영화의 제목도 ‘실락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심혜진, 이영하 주연으로 리메이크 했으나 실패했던 작품으로 기억한다. 당시 불륜 내용에 과도한 애정 표현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던 영화였다. 필자도 호기심으로 그 영화를 보러갔는데 마지막 장면에서의 내레이션은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가슴 아픈 공감을 주었다. 필자 또한 그 자리에서 두 번을 연속하여 보았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마지막 장면의 내레이션은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온다.
영화의 내용인 즉, 30대 중반의 주부와 50대의 평범한 가장이 우연히 만나고 그때서야 두 사람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란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 눈 덮인 산으로 떠나는 것으로 끝난다. 간통죄가 없는 일본적 정서가 한국과는 조금 달라서 한국 사람이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스토리 전개상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 실패했을 거라 생각이 든다. 그 영화의 파괴력은 일반적인 내용이나 스토리보다는 그것이 모든 관객의 아픔을 대신 표현해주었다는 데 있었다.
마지막 내레이션은 두 사람이 교대로 이야기를 한다. ‘남 : O년 O월 O일 나는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태어났다. 엄마는 기뻐하셨고, 아빠는 직장일로 조금 늦으셨다’. ‘여 : 여섯 살 때 엄마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입학하였다. 아빠는 꼭 참석하겠다고 하였으나 일이 바쁘셨는지 못 오셨다. 꼭 보고 싶었는데…’. ‘남 : 열세 살,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낯선 하루였다’. ‘여 : 열여덟 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다. 오늘도 역시 아빠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참석하지 못하였다, 아쉬움이 남는다’, ‘남 : 스물다섯 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였다’. ‘여 : 스물다섯 살 선을 보았다.
그냥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다’. ‘남 : 오늘 아이가 태어났다, 너무 기쁜 날이다. 빨리 집에 가서 보고 싶다’ ‘여 : 서른 살, 하루하루 남편과 아이를 돌보며 별일 없이 지내는데 지루하다’. ‘남 : 오늘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을 하는 날이다. 정말 꼭 참석하고 싶은데 일이 끝나지 않아서 도무지 갈 수가 없다. 약속한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여 : 오늘은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 기쁜 날이다’. ‘남 : 내일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다.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싶으나 내일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
미안하다…’. 이 같은 내레이션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이의 자화상이었다. 결국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이 과거에 겪었고 현재 겪고 있는 사연들이어서 진한 공감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쫛년 쫛월 쫛일 나는 그대(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사랑임을 알았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끝난다. 이 영화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매일매일을 행복감조차 잃어버리고 매너리즘 속에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그것을 파괴하는데 자극적인 사랑을 동원했던 영화였다.
지금도 우리는 그 내레이션의 내용처럼 그렇게 아침에 병원으로 출근을 하고, 환자를 보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간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또한 아빠가 우리 입학식에 참석 못했듯이 본인도 자식의 입학식에 참석을 못하는 아픔을 반복한다. 필자 역시 두 아이의 입학식을 못 보았고 졸업식도 못 보았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였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출근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사는가는 정해져 있으므로 그 안에서 어떻게 느끼며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잃어버린 낙원인 현실 속에서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정한 낙원을 찾은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