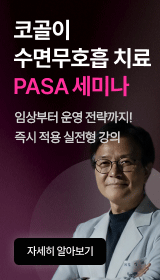1950년대 미국에서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서로 용감함을 자랑하기 위해 자동차로 마주보고 달리며 피하는 사람이 겁쟁이(chicken)인 것이 증명되는 게임이 유행했다. 치킨게임이다.
이 게임에는 3가지 결과가 있다. 가장 흔한 경우로 조금이라도 겁이 더 많은 자가 핸들을 돌려서 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둘 다 죽기로 각오하고 버티다가 같이 부딪치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다. 셋째는 동시에 피하는 것으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최선의 경우지만 빠르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가 동시에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치킨게임에 대해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는 모두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출발하자마자 차의 방향을 고정하고 누군가 먼저 핸들을 떼어 상대방이 볼 수 있게 차창 밖으로 버리는 방법이다. 자신은 선택 방법이 없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며 선택권이 핸들을 버리지 않은 상대방에게 옮겨지게 하는 것으로 가장 무모한 방법이다. 물론 두 사람이 동시에 버린다면 이 또한 운명이다. 두 번째는 누군가 제3자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동시에 핸들을 꺾으라고 둘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둘 다 자존심을 세우고 사고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둘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자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몇몇 언론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에 대해 치킨게임으로 정의하는 기사들이 보인다. 의협은 진료를 안 하는 것으로 협상카드를 잡았고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를 카드로 잡았다.
강경파인 신임 의협 회장은 2,000명 증원 원점협상을 넘어 대통령의 사과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조건은 몇 가지 의아함을 준다. 현실성이 없는 조건을 던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협상을 이끌기 위한 트릭인 것인가. 치킨게임에서 핸들을 버린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인가. 여당에 반대하는 선거 투쟁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다. 물론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경질을 요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느낌은 문제가 있다. 객관적 공감을 잃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에게 과거 선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철칙이 하나 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즉시 화를 내며 답변하면 안 된다. 외국어가 서투를 때 화까지 나면 더욱 말을 더듬고 더 빈약해 보일 수 있고 제3자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를 누르고 시간을 조금 두고 차분히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의협이 화가 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의협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제3자에 대해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정부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라디오에 지속적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공익방송을 시간마다 하고 있다. 심지어 지하철 내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몇몇 언론이 이번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파악한 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치킨게임은 비슷한 크기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만약 한쪽이 자동차인 반면 반대편이 탱크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애초부터 치킨게임이 아니다. 만약 자동차가 핸들을 버렸는데 탱크가 피하는 속도가 느리다면 일방적인 치명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던지며 전개된 지금 상황에서 1,000명으로 줄여도 정부는 애초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비난을 받지 않고 대의를 위해서 양보했다는 느낌과 의협의 체면을 세워 주었다는 모양새가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인 심리적 마지노선은 1,500명 정도일 것이다. 그 이하가 된다면 정부는 엄청난 비난을 직면해야 한다. 결국 정부도 물러날 길을 잃었다.
알았든 몰랐든 2,000명을 던진 순간이 바로 정부가 탱크의 핸들을 먼저 던져버린 순간이었다. 의협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이유다. 부디 좋은 결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