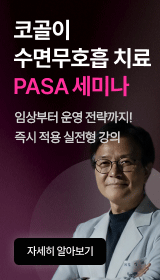현재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급여 보고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진료내역 등’이다.
현행 의료법 어디에도 없는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복지부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법령상의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즉, 급여 진료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서 국회가 정하는 ‘법’의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통해 기한과 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에 비춰볼 때 마찬가지로 입법부인 국회가 정하는 법 조항으로 정의해도 모자람이 없음에도, 행정부가 입법부의 간섭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고시로 개인의 비급여 진료내역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모두 수집하기 위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애당초 입법취지에 밝혔던 병·의원의 비급여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현황 조사나 통계를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에서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은 시행조차 하질 않고 개인정보를 언제든 포함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택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의 과도한 행정집행 혹은 시장경제에 대한 과한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환자의 민감 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 중에서 정신과 진료내역을 예로 들면, 정신과는 병의원 내원 시 접수부터 진료 여부의 노출을 꺼리는 환자들의 특성상 보험급여 혹은 보험급여가 가능함에도 비급여로 접수해 진료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상의 내밀한 정보라는 뜻이다.
이 ‘진료내역 등’이 최근 논란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안 등을 통해 사보험으로 데이터가 넘어갈 경우 몇몇 영화가 다루었던 것처럼 개인의 수명을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질병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여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취업이나 여러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에서는 개인정보 중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의료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단독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와 같이 보험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명확히 분류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보험법과 크게 대비된다.
개인정보 중 의료정보의 가치는 2020년에만도 미국에서 8건 이상의 악의적 해킹 공격으로 107만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제약, 의료기기 산업 등에서 환자들의 급여, 비급여 진료내역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제품의 효능 등을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빅데이터가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환자의 의료정보를 누군가 모두 파악하여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국민의 유전적, 의료적 약점이 단체적 혹은 개인적으로 파악되기 쉽다는 단점이 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크게 보고 멀리 보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밀한 개인의 정보는 그 자체로써 존중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