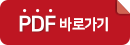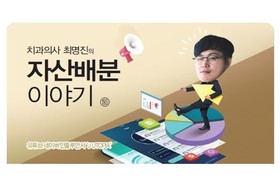칼세이건(Carl Sagan)은 1934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출생한 천문학 박사이자 천체물리학자다. 칼 세이건은 행성 표면과 대기상태, 외계생명체 존재 가능성 등을 비롯해 태양계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했고 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칼세이건(Carl Sagan)은 1934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출생한 천문학 박사이자 천체물리학자다. 칼 세이건은 행성 표면과 대기상태, 외계생명체 존재 가능성 등을 비롯해 태양계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했고 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 ‘우주와의 접촉’ 책이 출간되면서 명쾌한 서술로 명성을 얻었다. 1980년에 방영된 ‘코스모스’ 프로의 공동제작자이자 해설자로 활동하였는데 전 세계 7억 5,000만명이 시청한 인기 다큐였다. 이후 칼 세이건은 프로그램 내용을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집필했고 많은 사람에게 우주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려 대중화에 힘썼다. 과학 도서 중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 바로 ‘코스모스’일 것이다.
멀리서 찍힌 푸른 지구별 사진은 익히 알고 있다.
칼 세이건은 푸른 지구별만큼 인간의 자만이 어리석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푸른 지구별은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유일한 보금자리를 소중히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지구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삶을 영위하는 그곳이다.
지구 위에서 유사 이래 모든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영웅과 겁쟁이, 모든 왕좌와 농부, 사랑에 빠진 모든 연인들, 모든 위대한 지도자,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태양 빛에 부유하는 먼지 티끌처럼 살다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지구도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에서는 극히 작은 무대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복자가 찰나 동안 파란 지구의 점 일부분을 지배하려 했던 까닭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러야 했나. 지구의 한 점인 극히 일부를 점유했던 주민들이 다른 영역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자주 불화를 일으켰으며 얼마나 서로를 죽이고 싶어했고 얼마나 서로를 열렬히 증오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 우리의 만용, 자만심 그리고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자.
만일 지구에서 바라보는 일곱 개의 별이 만들어낸 북두칠성을 태양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다른 행성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별자리 모양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별을 바라보는 위치가 변함에 따라 같은 별들이 이루게 되는 별자리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별 또한 인간들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국 죽어 사라진다.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 안 되는 데 비하여 별의 수명은 인간의 수억 배나 된다. 별의 일생에 비한다면 인간의일생은 찰나이다. 그렇다면 별의 눈으로 본 인간의 삶은 어떨까?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작은 공만한 지구 안에서 10억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만 반짝하고 사라지면서 그렇게 대립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신조어가 넘쳐난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들은 갈라치기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두 개로 쪼갰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서로를 극도로 경멸하게 되었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 남발되며 우리 사회근간인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권력자와 정치인, 수사기관까지 입맛에 따라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격돌하는 양상이다. 이제는 무의미한 논란을 종식하고, 사회를 갈라치기하는 정치적 선동을 멈춰야 할 때다. 법과 원칙,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
이 푸른 지구별 작은 행성이 수많은 전쟁과 배신, 대립이 난무하는 각축장이지만 우주에서는 하나의 점일 뿐이자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기에도 찰나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