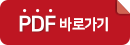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두 교황’, 이 영화는 지난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의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 사이의 실제 이야기에 기반을 둔 영화다. 두 교황은 가톨릭 내부에선 각각 ‘진보’와 ‘보수’로 성향이 전혀 달랐다.
‘두 교황’, 이 영화는 지난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의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 사이의 실제 이야기에 기반을 둔 영화다. 두 교황은 가톨릭 내부에선 각각 ‘진보’와 ‘보수’로 성향이 전혀 달랐다.
보수적인 가톨릭 전통과 교리를 고수하던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 파격적인 선택을 한다. ‘고령’을 이유로 종신 교황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가톨릭 역사상 6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교황의 선택은 사제들의 성추행 추문으로 위기를 맞고 있던 가톨릭교회를 살리기 위한 용기였다는 외부적인 평가를 받았다.
영화에서 베네딕토 16세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엔 너무 늙었고, 너무 지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교황 앞에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될 사람이 나타난다. 당시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이었던 베르고글리오는 베네딕토 16세와는 전혀 성향이 달랐다. 교회는 변해야 한다고 믿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는 사제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부터 정말 인간적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한다. 서로 대화하면서부터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실수, 회한, 나아가 믿음과 용서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다. 사제 추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죄책감을 고백하는 베네딕토 16세,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사제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황도 현실 속 부조리를 고민하고 이를 극복하려 애써온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영화는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장면 하나 없이도 두 교황이 조용히 대화하는 그것만으로 영화를 이끌어가는데, 신념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듣고 이해하려 애쓴다는 게 지금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특히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베네딕토가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절실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좋아한다. 이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영화 ‘두 교황’은 다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나를 용서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4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그가 오랫동안 당부했던 대로 소박하지만 장엄했다. 유언에 따라 아무런 장식 없는 교황의 목관을 운구하는 것으로 시작된 교황과 전 세계인과의 마지막 만남은 그 소박함이 만들어내는 남다른 의미로 전 세계에 또 한 번 울림을 남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들과 달리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안장되기를 원해 장례 미사가 끝난 뒤 교황의 관을 실은 운구차는 로마 시내를 가로질러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향했다. 운구차마저 그가 2015년 필리핀 방문 때 탔던 전용 의전 차량을 개조한 것이다. 과거 교황 때는 사이프러스와 아연, 참나무 등 세 겹으로 된 삼중관 입관 절차를 거쳤으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연으로 내부를 덧댄 목관 하나만 쓰도록 했다. 관이 놓이는 위치에는 흰 대리석 받침에 ‘프란치스코’라는 라틴어 이름만 새겨졌다. 이 역시 교황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무덤 위에는 흰 장미 한 송이가 놓였고, 그 위 벽에 걸린 십자가를 부드러운 빛 한줄기가 비추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너무나 달랐던 두 교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했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는 대화와 상호 이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정치적으로 단일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기는커녕 단일화는 더 멀어지고 있다.
치과계도 매번 선거를 앞두면 단일화에 관한 말만 분분했고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상대방과 의견과 생각이 다름을 이해하려 한 적이 없고, 남은 틀리고 나만이 맞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의견을 듣고,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단일화도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