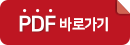미국의 35대 대통령인 John F. Kennedy는 1961년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으십시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대통령 취임연설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젊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민주주의의 의무를 강조한 대담한 요구를 담은 명연설로 역사에 남아 있다. 아마 협회장도 연설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은 연설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지금 치과계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여러 집단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결국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문제는 해결을 포기하고 ‘기한부유보’라는 미봉책으로 처리를 미뤄 놓았다. 분열을 막았다는 자조 섞인 평도 있지만 이것은 분열을 막았다기보다는 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분열할 시간을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지난 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냈든지, 어느 누군가는 몰매를 맞는 구조에서 당장은 이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든다. 국가도 중대사에 대하여는 국민투표를 하듯이 치과의사전문의 문제와 같은 중대사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직접투표에 붙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의원들이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200명이 넘는 대의원 중 과연 몇 명이 지난해 4회에 걸쳐 진행된 전문의 관련 공청회에 참석을 하였는지, 또 대의원 개개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2만명이 넘는 치과의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하였는지 궁금하다. 지나간 문제는 그렇다하더라도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는 대의원들이 그들의 권리가 아닌 의무에 충실한 고민을 하기를 간절히 요구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협회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밀어붙이기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민주의식에 입각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했는지 의심이 된다. 그들이 과연 공청회에 몇 차례나 참여했는지, 또 그들 단체는 자체적으로 몇 번의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기회를 통하여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 몇 명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 집단의 회원들이 동조한 정도인지도 먼저 밝혔어야 옳다.
치과의사 개인도 민주시민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회람을 통한 대부분의 의견 수렴에서 응답률은 30% 전후이다. 이를 보면 어쩌면 많은 수의 치과의사들이 누가 협회장인지, 그 사람이 어떤 주장으로 회장이 되었는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전 집행부와는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떤 경력이 있는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전문의 문제도 원래는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될 뿐이고 솔직히 종전대로 했으면 싶은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른다. 협회장 선거가 간선제이든, 직선제도 관심은 없지만, 내심 직선제가 되면 선거하러 오라 가라 귀찮게 할까봐 신경이 쓰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건강권과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이런 때 치과의사들이 사분오열되어 있다면 협회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도 치과의사들을 지켜줄 수 없다. 로마시대에는 로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주었다. 지금은 치과의사들이 치과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