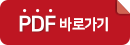첫눈이 내렸다. 첫눈치고는 엄청난 양이었다. 습설이었던 탓에 헌법재판소 내에 있던 600년 된 천연기념물 소나무 가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원주에서는 50중 추돌사고도 있었다. 첫눈이 많이 내린 탓이다.
그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대한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오후 9시경에 착륙했다. 그 후에 발생한 일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계류장은 비행기에서 250m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계류장에 붙기까지 5시간 30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승객들은 기내에 갇혀 있었고, 기장은 관제탑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인천공항은 버스를 준비하는 등의 어떤 조치도 없었다. 새벽 2시가 지나서 겨우 계류장에 비행기를 붙였는데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다. 결국 다시 승무원들이 공항 측에 연락을 하고서야 겨우 게이트가 열렸다. 짐을 찾는 곳에서 30분 동안 전광판이 꺼져 있어서 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날 하와이에서 출발한 일부 노선은 꼬박 7시간 넘게 기내에서 대기하기도 했다는 기사도 보인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빨리빨리’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그것도 인천공항에서 국적기인 대한항공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승객이 모두 차야만 출발하는 인도도 아니고, 시간 되면 무조건 칼퇴근하는 캐나다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선 한 가지 생각이 스친다. 승객 250명 중에 총리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국토부국장이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승객 250명 중에는 전화 한 통으로 인천공항 사장이나 대한항공 회장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위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전화하면 사장과 회장은 즉시 공항으로 달려와서 해결했을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을 끝까지 임무 완수하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지닌 직원이 그날 비번이었을 가능성이다. 모든 조직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의 희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인천공항은 이미 오래된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발생은 경험 미숙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인도와 같은 문제라기보다는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식 문제로 생각된다. 직업의식보다는 개인주의로 칼퇴근과 책임회피가 만들어낸 결과다. 자신이 하던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개념보다는 퇴근 시간이 되었으니 자신은 퇴근하면 책임이 없다는 개념이다. 사실 처음 캐나다나 미국 관공서에 갔을 때 경험하는 답답함이 그런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급한데도 일을 처리하는 자들은 여유롭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기내에서 5시간 30분을 대기하는 승객들보다는 자신의 퇴근시간이 더 중요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일들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미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이 5시 30분이 되면 칼퇴근하는 것은 종종 목격되었던 일이다. 이제 준 관공서급인 인천공항에서 발생했으니 앞으로 관공서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달리 땅이 좁고 천연자원이 없다. 우리처럼 사람만이 자원인 나라와는 다르다. 그들은 좀 느리게 일하고 칼퇴근해도 먹고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처럼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칼퇴근을 위해서 승객들이 기내에서 5시간 30분 동안 기다리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국가적 경쟁력은 급격히 퇴화할 것이다. 물론 갑자기 내린 폭설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려 해도 5시간 30분은 아니다. 계류장의 게이트가 열려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짐 찾는 곳을 가르쳐주는 전광판이 30분 늦게 나타난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담당자가 없었다는 의미다. 업무 인수인계 없이 칼퇴근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사회라면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