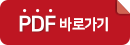2024년 폐업한 커피숍 수가 1만 2,200여 개라고 한다. 하루에 34개 커피숍이 폐업한 셈이다. “하루걸러 하나꼴로 커피숍이 생긴다”고 생각했더니 한 빌딩에 4~5개가 들어섰던 커피숍이 이제 생존게임이 된 것이다. ‘한 집 걸러 한 집’ 보이던 커피숍이 호황에는 잘 버텼지만, 장기화한 경기 부진에 소비가 줄자 폐업에 내몰린 것이다. 원두 가격이 1년 동안 2배 치솟았고, 최저임금에 동반된 아르바이트 비용 등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순이익이 바닥을 쳤다.
2024년 폐업한 커피숍 수가 1만 2,200여 개라고 한다. 하루에 34개 커피숍이 폐업한 셈이다. “하루걸러 하나꼴로 커피숍이 생긴다”고 생각했더니 한 빌딩에 4~5개가 들어섰던 커피숍이 이제 생존게임이 된 것이다. ‘한 집 걸러 한 집’ 보이던 커피숍이 호황에는 잘 버텼지만, 장기화한 경기 부진에 소비가 줄자 폐업에 내몰린 것이다. 원두 가격이 1년 동안 2배 치솟았고, 최저임금에 동반된 아르바이트 비용 등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순이익이 바닥을 쳤다.
전문가는 폐업하는 커피숍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를 인구수 대비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이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운영할 수 있어, 특히 커피숍이 브랜드화된 우리나라에서는 빠르면 3~4개월이면 가게를 낼 수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커피전문점 수는 10만 개를 돌파했고, 이는 2016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불과 6년 만이다. 같은 건물에 여러 브랜드가 있어도 규제는 없다. 필자가 개원하는 근처 한 빌딩에는 직장인이 많아서인지 한 건물에 각기 다른 브랜드로 5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커피숍이 과밀한 서울에서는 2024년 지난 한 해에만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4,600여 개가 문을 닫았다. 평균 영업 기간도 3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했더니, 딱 현재 치과계 이야기다.
건물만 생기면 치과가 가장 먼저, 가장 비싼 임대료로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같은 건물에 2~3개가 우후죽순 난립하는 의료기관은 치과밖에 없다. 장기화한 경기 불황으로 ‘생존게임’에 내몰렸고, 인건비는 몇 년 동안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치솟았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으니, 순이익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 적자를 감내하는 동네치과가 많다. 큰 비용을 들여 신규 개원한 치과의원은 3년을 못 넘기고 폐업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양도하기가 다반사다.
과거에 많은 선배들이 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 치과대학이 너무 많다고 힘줘 목소리를 냈었다. 치과대학 정원 수를 조정해서 졸업생 수를 줄이지 않으면 과잉 경쟁, 수가 하락 등에 내몰릴 것으로 예측했고 그대로 현실이 됐다. 본지에서는 2024년 창간 31주년 기획을 통해 치과의사 공급을 바로 못 줄인다면 지역별 편중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지역을 개원지로 선택한다면 치과 간 경쟁도 줄이고 치과의료 공급의 지역 불균형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폐업하는 치과의원 대다수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전문가는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커피숍이 사라지는 이유 중 큰 원인으로 공격적인 저가 커피 브랜드를 들었다. “저가 커피 브랜드는 생태교란종이다. 저가 커피 브랜드 한 곳이 들어서면 오랜 기간 잘 영업하던 개인 매장 3~4곳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고 분석했다. 막대한 광고료를 지출하며 ‘출혈경쟁’을 감수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와 커피 향과 맛 하나를 자부심으로 단골을 확보했던 개인 커피숍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하나로 수십 년간 동네 터줏대감처럼 동네 주민들을 책임졌던 개인 치과의원은 저가 공장형 치과가 인근에 들어서면 5곳 이상, 많게는 수십 곳이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는 저가 공장형 치과는 한 달에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3,000개면 적자, 4,000개가 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한다. 저가 공장형 치과 한 곳에서 한 달에 식립하는 임플란트 건수가 동네치과 100여 곳이 1년에 수술하는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것 같다.
이처럼 저가 공장형 치과는 생태계 교란종이다. 저렴한 진료비로 현혹해 치료비를 받고 나서는 사후 관리를 책임지지 않고, 정기적인 구강 관리는 시간이 없어 못 봐준다는 합의서를 쓰게 한다는 저가 공장형 치과로 주변 치과의원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