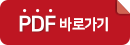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경기가 어려울수록 규모가 큰 치과부터 타격을 받는다”는 말은 역시 정설이었을까. 최근 공동개원을 포기하고 단독개원을 시작하는 중년의 치과의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3명의 동기가 공동개원을 하면서 치과규모도 키우고 직원도 늘렸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동료 치과의사와 공동개원을 했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수익배분에 대한 서로의 불만이 쌓였다”, “오랜 기간 같이 치과를 운영해왔지만 페이닥터로 지낸 탓에 경기가 안 좋으니 나가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들었다”는 경우까지 단독개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다양했다.
 공동개원에서 단독개원으로 돌아설 경우 불거지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공동투자한 치과 장비 등에 대한 지분 문제는 물론, 뒤늦게 시작하는 단독개원은 개설신고 하나부터 낯선 일 투성이다. 공동개원하던 원장 중 한 명이 그 치과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분에 대한 계산만 하면 된다지만 각자 새로운 치과를 인수하게 될 경우 기존 장비들을 나누거나 매매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공동개원에서 단독개원으로 돌아설 경우 불거지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공동투자한 치과 장비 등에 대한 지분 문제는 물론, 뒤늦게 시작하는 단독개원은 개설신고 하나부터 낯선 일 투성이다. 공동개원하던 원장 중 한 명이 그 치과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분에 대한 계산만 하면 된다지만 각자 새로운 치과를 인수하게 될 경우 기존 장비들을 나누거나 매매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공동개원의 가장 어려운 점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창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동개원 시는 단독개원보다 규모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나에게 부족한 진료영역을 메워주기 위해 각기 다른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이 공동개원으로 힘을 모으는 경우도 문제는 여전하다. 내가 못하는 교정영역을 보완해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잠시, “실제 진료수입은 내가 훨씬 더 많이 올리는데 수익배분은 똑같은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10여년 동안 공동개원을 해오다 최근 새로운 치과를 인수해 단독개원으로 선회했다는 서울의 한 개원의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신규개원의로 첫발을 내딛는 것이 쉽지는 않다”면서 “공동개원을 하면서 등한시했던 병원관리부터 회계까지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새로운 곳에서 신환을 늘려가야 한다는 부담도 중년 치과의사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공동개원으로 성공한 치과의사들은 공통적으로 “공동개원은 돈보다는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1=2’가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실패하기 쉽다. 수입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할 경우 공동개원이 적합하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