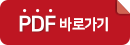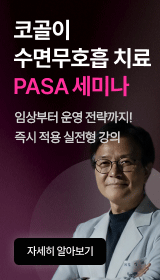예전부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홀수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홀수는 밝음과 양(陽)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다. 반면 짝수는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음(陰)으로 어둠의 의미가 있다. 동양사상에서는 완성이란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미완성을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항룡유회(가장 높이 오른 용은 후회를 한다)처럼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내려온 것밖에 남지 않아서 경계하는 것도 같은 의미다.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월과 날이 겹치는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등은 좋은 날로 생각하였다. 이에 그날들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명절이다.
설날 1월 1일은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날로 자신이 마음을 다짐하는 날(修身)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시작이 수신(修身:스스로 마음을 바로잡음)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큰 추석은 9월 9일이 되어야 했지만, 9는 10이 되기 직전에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너무 좋으면 안 된다는 항룡유회적 사고관과 달이 가장 크게 뜨는 보름(15일)에 조상의 덕으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추석으로 정했다. 달은 음이 가장 큰 것이고 조상을 기리는 의미에서 음이 가장 큰 때가 보름이다. 음(조상)이 가장 큰 때라서 음덕(陰德)이다.
다음으로 3월 3일이어야 하지만, 3 또한 강한 완성의 의미(그릇이 다리가 3개면 홀로 설 수 있다)를 지니기 때문에 이중을 피하여 3월 3일이 아닌 동지에서 105일이 지난 날을 한식으로 정했다. 이날은 중국 춘추시대에 충신 개자추가 불에 타죽은 날이다. 개자추는 늙은 노모를 봉양하러 가면서 논공행상에서 제외되었다. 오랜 세월 후에 왕이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불에 타죽었고 안타까움과 충효의 대명사가 되었다. 유교 덕목인 충효를 넣은 날로 한식이 되었다.
다음은 5월 5일 단오다. 단오 역시 충신을 기리는 날이다. 중국 춘추전국시절 초나라 충신 굴원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굴원의 충언을 듣지 않은 왕은 타국에서 인질로 잡히고 결국에는 사망한다. 왕이 죽자 끝까지 말리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투신자살한 날이 5월 5일이었다. 끝까지 충성스러웠던 굴원을 기리기 위한 날이 단오다. 이렇게 4대 명절이 정해졌다.
다음은 7월 7일 칠석이다. 칠석은 4대 명절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일하게 충효사상이 아니다. 사랑이 주제다. 실체가 없는 전설을 모티브로 하였다. 칠석은 동아시아 전설 속에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을 명절로 하였다. 이날만이 충효와 상관없는 남녀 간의 사랑 의미를 지닌 것은 아마도 유래가 다르기 때문이라 유추된다. 동아시아에서 7은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북두칠성은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별자리며 신앙이며 신이었다. 이런 유목민들의 사상이 농경사회의 정착민에 접목된 것이 칠석이라 유추되며, 농경사회의 충효유교사상 때문에 순위가 밀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11월 11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념일이 없이 빼빼로데이일 뿐이다. 이것은 동양사상에서 10이 넘으면 다시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1이란 숫자는 의미 없기 때문이다.
결국 농사가 근본인 농경사회에서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설날과 수확을 하는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이 되었다. 다음으로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여 농사준비를 해야 하는 농부가 땅을 관찰하는 날이 한식이고, 모내기를 끝내고 고생한 노고를 달래는 축제가 단오다. 결국 4대 명절날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요즘처럼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형태가 없던 농경사회에서는 매일 일을 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날들은 두 달 간격으로 배치되어서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모두가 놀고 쉴 수 있게 하였다. 합리적, 문화적 형태였다. 거기에 충효 의미를 부여하여 방해를 차단하였다. 남녀 사랑(번식)은 외래문화 형식으로 유목민의 사상과 문화를 도입하였다. 농경사회가 아닌 지금 이런 의미가 모두 잊혀지고 퇴색되어 생활이 아닌 문화로만 남았다. 우리 문화에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문명을 바탕으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녹아있다. 그중 하나가 설날이다.
설날 아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