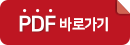국세청은 지난 2011년 2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병의원, 변호사 사무실,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로 지정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20%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모든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집계하여 신용카드 매출로 처리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에 대한 고시안을 잘 지킨다면 공단 부담금을 뺀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이 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공단부담금 외의 현금매출을 신고한 치과는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의 혐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 Norm이 77%라면서 그보다 많은 신용카드 매출을 거둔 치과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있다고 경고한다.
2009년 2월 4일부터 3만원 이상의 경비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 혹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치과소모품이나 물품구입을 카드로 하였더니 이번에는 카드사용을 소비지출로 추측해 이 소비지출이 Norm보다 많다며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 같다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2002년에 폐지된 ‘표준소득율’이라는 것이 있었다. 특정한 직종은 매출대비 일정한 비율의 소득이 생긴다고 가정한 것인데, 누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한지에 대하여는 설명한 적이 없다. 지금은 대안인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데 이 역시 이름만 소득에서 경비로 바뀐 것으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득이라는 것이다. 치과는 직종코드 851211로 표준경비율은 61.7%이다. 이 값은 세무신고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Norm으로 활용된다. 대부분의 치과가 30%의 수익을 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40%에 육박하는 수익을 보고하지 않으면 일단은 위험군에 낀다고 보면 되겠다.
그 Norm은 보험청구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른바 적정성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Norm에 들지 못하면 잘못됐다고 알려준다. 그 알림 편지엔 필요하면 실사를 하겠다는 안내도 친절하게 쓰여 있다. 약을 며칠 더 투약해도, 드레싱을 몇 번 더 해도 엔도를 여러 번 해도 다 걸린다. 우리가 이 Norm에 맞추기 위해 약을 더 적게 투약하고 드레싱 숫자를 줄이면 얼마후엔 이 Norm은 더 낮아진다.
이 Norm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숫자의 집합을 통계라는 툴을 사용한 행정편의적인 것이다. 더구나 개인들이 노력하여 그 Norm에 접근하면 이번엔 이 Norm이 달라져서 다시 Norm에서 멀어지는 특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이 Norm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이 Norm이 잘못된 기준이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 불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과거에 치과의사들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회피할 곳이 없다. 이제는 이 문제를 깨고 나갈 고민과 노력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