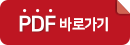카드사의 순이익은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에도 무려 3조 4천억원을 기록했었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업체의 카드수수료를 1.6~1.8%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금 치과의원의 카드수수료는 대부분은 2.7~3.0%이다. 반면 종합병원의 수수료는 1.5%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치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액수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이 줄줄이 오르다보니 매출감소로 빠듯해진 치과 운영에는 큰 돈이다. 그것도 대형병원보다 두 배나 많이 낸다고 생각하니 속이 터진다. 정부는 카드사용을 확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치과와 카드회사가 알아서 하란다. 초기에는 거액을 주고 카드 단말기도 구입하여야 했다.
카드매출금의 지급도 길게는 10일이 걸린다. 현금으로 받던 진료비를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기계설치하고 매번 전화비 물어가며 카드 조회하고, 그것도 며칠씩 걸려서 늦게 받는데도 오히려 카드사에 수수료를 떼어 주어야 한다. 작은 규모의 병원은 큰 병원들보다 더 많이 떼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드디어, 의약 4단체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한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자.
또 있다. 모든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이름은 면세사업자이지만 장비나 재료 매입할 때는 부가세를 꼬박꼬박 낸다. 일반 사업자는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그러나 의료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그 재화의 최종소비자가 단 한 번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가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의료행위의 재화의 최종 소비자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다.
어떻게 보면 환자가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의료기관이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면세사업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기초 생필품이나 국민후생용역과 관련하여 최종소비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료에서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가 면세라고 생색은 내면서도 정작 부가가치세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도 아까웠는지 지속적으로 병원비에 부가가치세를 얹으려는 노력을 해왔고, 2011년 7월부터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곧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면세사업자에 대한 진정한 입법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면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의 최종 지불자가 돼서는 안된다. 의료기관이 매입에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최종소비자인 환자의 부담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의료인 단체도 불합리한 면세사업자 제도에 토를 단 적이 없다.
그동안 의료인은 많은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에 대하여도 침묵하여 왔다.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어쩌면 자신이 찾아 먹어야 할 것도 체면 때문에 포기하였는지도 모른다. 카드 수수료든 세금문제든 좀 더 적극적으로 집단의 의지를 결집하여야 하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치과의사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