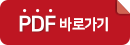올해 갑진년 마지막 글을 쓰려니 떠오른 문구가 있다. 亢龍有悔(항룡유회) 窮之災也(궁지재야)다. 이 문구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였던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역경(주역)의 제일 첫 번째인 건괘에 제일 윗 효에 나오는 문구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의미다.
건괘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첫 효로 ‘潛龍勿用(잠룡물용)’이다. 땅속 깊이 있는 용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에 상응하는 가장 위에 있고 마지막 효가 亢龍有悔(항룡유회)’로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謙遜自重(겸손자중)하라는 뜻이다. 오를 대로 올라갔으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동양철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본으로 한다(유시유종 有始有終). 역경의 시작은 잠룡이 뜻을 세운 후에 가만히 때를 기다리라 하고, 오르는 용은 끝까지 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끝까지 오른 용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만 남았음을 의미하고, 또 높이 오른 용을 밑을 내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늘 그렇듯이 ‘송년’하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로 먼저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무엇보다도 모든 뉴스가 비상계엄으로 시작되어 탄핵이란 단어로 집약된다. 최근 뉴스와 청문회를 통해서 평생 보지 못했던 수많은 별(장성)들과 경찰 최고 수뇌부들을 보면서 항룡유회가 떠올랐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용이었다. 이번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충격이 목적이었다면 확실하게 대성공이다. 국회가 둘로 쪼개졌음을 확실히 보았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리 시위현장도 둘로 나뉘었음을 목도하였다.
한 편의 옳음을 다른 편에서는 그르다 하고, 한 편의 그름을 다른 편에서는 옳다고 한다. 정반(正反)이다. 정반은 합을 이루지 못하면 분열로 끝나고 만다. 결국 정반합(正反合)이 되어야 그 사회가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차후에 더 성숙되고 발전되어 있을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 동안 고통의 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판에 등장하는 한나라와 초나라 싸움에서 한나라가 이기며 빨간색이 되었다. 한나라는 유방이 있었고 초나라는 항우가 있었다. 항우는 천하장사이며 모든 것에 능한 반면, 유방은 유약하였지만 기다릴 줄 알았다. 역사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싸움에서 유방이 이긴 이유로 항우의 자만심과 우유부단을 꼽았다. 반면 유방은 항상 자신을 낮추었다. 결국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마지막 단 한 번의 싸움에 지면서 전쟁이 끝났다. 모든 전쟁에서 지도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하면 지는 것은 중국 고전 ‘삼국지’나 일본 고전 ‘대망’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씨름에서 힘으로 먼저 넘기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모래판에 먼저 닿는 것이 아닌 것은 상식이다. 군과 경찰에서 끝까지 오른 그들은 과연 무엇을 더 이루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 끝까지 올랐으니 장량처럼 멈추고(知止) 모든 것을 던질 수 없었을까.
유방에게는 지략가 장량, 경영의 소하, 전쟁의 신 한신이 있었다. 이 셋은 모두 다른 길을 갔다. 한신은 누리다가 토사구팽이란 고사성어를 남기고 사라졌다. 떠나지 못한 소하는 말년에 치욕스러웠다. 장량은 유방의 핵심 참모 지략가로 항우를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개국 공신이었다. 유방은 장량의 조언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 그런 장량은 논공행상 시기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 심지어 그의 묘지도 모른다. 중국 최고 관광지인 장가계가 장량의 묘지가 어딘가에 있는 곳이란 의미에서 나왔다.
최고의 별들이 장량처럼 떠날 수 있었다면 이런 사건도 없었고 그들이 평생 이룬 명예를 더럽히는 일도 없었다. 아직도 비현실적인 느낌이며 지속되는 의문이다. 그들은 과연 꼭 그런 판단과 선택밖에 없었을까. 산 정상에 올라 보지 못한 자가 모르는 오른 자들만이 아는 무엇이 있는가. 역경은 ‘항룡후회’로 그런 것은 없음을 가르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