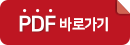지난주 검색엔진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의대생 성폭행’은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다.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상식적으로 6년을 같이 지낸 급우에게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고, 이 사건 후에 한 공간에서 기말고사를 같이 치르게 한 학교의 처사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한 배우는 자신의 트위터에 “괴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가해자들의 출교를 원한다는 청원에 동참한 네티즌은 만 명을 넘어섰다.
이 사건에 보이는 많은 사람의 관심은 의사에 대한 대중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평소에는 열심히 하고 잘해도 칭찬 한 마디 없다가 무슨 일만 터지면 너도나도 ‘사회지도층’이 어쩌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른바 ‘뒤통수 때리기’ 심리다.
어쩌면 이 사건이 다른 학교의 다른 학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번처럼 큰 이슈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말없이 보여준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국민은 의사나 치과의사들을 믿고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맡긴다. 이 신뢰는 단순히 기술적이고 지식적인 부분뿐 아니라 도덕적인 면도 포함된다. 기술적이고 지식적인 신뢰는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기준 이상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신뢰에 대하여 의사나 치과의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신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적 배경에 준하고 발전하는 최신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야 한다.
면허라는 울타리 안에서 궤변이나 아집으로 자신의 잘못된 진료를 합리화 시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또 대중들이 의사들에 대하여 요구하는 도덕적인 부분도 진료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사들을 환자나 속이는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진료에 대하여 설명할 때도 불신의 눈으로 볼 것이고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대중들의 의사들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동료의 잘못에 관대할 수 없다. 의대생 사태에서 일부 네티즌이 주장한 것처럼 의대나 치대의 학부 과정에서 윤리, 소양 교육이 좀 더 필요한지도 모른다.
또, 면허증을 받은 다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재충전은 국민의 도덕적인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그러기에 의사, 치과의사 보수교육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많이 편성해야 할 것이다.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 중 의사나 치과의사처럼 보수교육을 열심히 하는 집단도 없다. 억지로 해야 하는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겠지만 이 보수교육은 의료인을 다른 면허집단과 차별화하고 대중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인식을 하고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