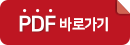공중파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토론을 한다기에 방송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들린 충격적인 말에 ‘내가 뭘 잘못 들었나’하고 귀를 의심했다.
공중파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토론을 한다기에 방송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들린 충격적인 말에 ‘내가 뭘 잘못 들었나’하고 귀를 의심했다.
패널로 나온 한 변호사가 “오해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435만원이지만 병원급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 600만원이다. 그리고 개원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 “의사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만 맞추면 의료수가 원가는 73%가 아니라 100%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로 제시한 수치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의료에서 의사의 인건비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인건비를 낮추면 원가는 경제학적으로 맞을 것이다. 의료수가에 대한 논의에서 의사의 적정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지에 대해서는 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 변호사의 언급대로 병원급 의사가 1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이래 의료 관련 이슈가 터지면 인터넷상에서는 왜 의사가 그만큼이나 받아야 하느냐는 비아냥도 나돌았다. 이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의사의 적정인건비는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2011년판 국세통계 연보를 보니 전체 근로자 1,514만 명 중 억대연봉자는 27만 9,000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시가총액 30대 민간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을 찾아보니 5,900만 원이 제일 높았고 마지막 30번째 기업도 신입사원에게 3,300만 원을 주었다. 그렇다면 의사가 대기업 신입사원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사회적인 상식선에서 의사가 3,000만 원의 연봉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공감이 가는 이야기일까? 의사라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에서 얼마를 받든 묵묵히 환자를 진료해야만 하는 걸까?
충격적인 이야기는 또 있다. 분명 내가 낸 등록금으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다닌 것 같은데 그 변호사는 “5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에서 의과대학을 보조해줘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의료는 공공재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의사는 알아서 무료봉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일까? 나도 개원을 했는데, 내가 치과를 개설할 당시 국가에서 무엇인가를 해주었는데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짧은 시간에 너무도 많은 의문이 생기며 순간적인 혼란에 휩싸였다.
그 변호사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며 환자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병원을 대상으로 많은 소송을 걸었던 변호사다. 정말 억울한 환자의 권리를 찾아준 것인지, 아니면 환자를 꼬드겨서 분란을 만든 것인지도 이제는 의심스럽다. 경실련에서 의료정책 전문가로 꼽혀 보건의료위원장도 맡았었다고 한다. 현재는 건정심 위원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을 책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한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일부 희생자가 생길 수 있지만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문제는 국가가 보상해주면 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시행해야 하는 건강보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그 날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였고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의사는 적은 인건비에도 감사하며 입 다물고 의료수가만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의사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며, 또한 국민들은 어째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돈에 맞는 최소의 진료를 강제로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 암담하다. 우리가 어떤 반론을 할 가치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