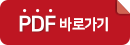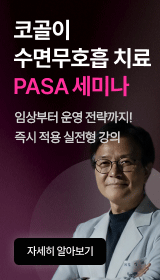‘20대는 노동청에서 배워 꿀 빠는 법만 빠삭한 무능력, 무책임한 근로자’라는 헤드라인, ‘10대가 출산하면 대학입학자격을 줘야한다’는 모 사교육업체대표 관련기사, ‘교회에서 목사 선임을 둘러싼 교인간 집단난투극이 발생해 경찰 수십명이 출동소동’ 이야기, ‘운행중인 버스내에서 흡연취객, 만류하는 버스기사 얼굴에 방뇨와 폭행’ 의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다.
‘20대는 노동청에서 배워 꿀 빠는 법만 빠삭한 무능력, 무책임한 근로자’라는 헤드라인, ‘10대가 출산하면 대학입학자격을 줘야한다’는 모 사교육업체대표 관련기사, ‘교회에서 목사 선임을 둘러싼 교인간 집단난투극이 발생해 경찰 수십명이 출동소동’ 이야기, ‘운행중인 버스내에서 흡연취객, 만류하는 버스기사 얼굴에 방뇨와 폭행’ 의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다.
첫 마디가 쇼킹해야 눈길을 사로잡고, 광고가 붙는(?) 시대이기에 미디어들이 선택한 길이지만 펜은 창보다 강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미디어가 그들의 자존심인 펜의 위엄과 기백의 뿌리를 스스로 흔들어 뽑으려는 듯하여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류가 시도해 본 이데올로기 중 그래도 그중 낫다고 아직은 인정받는,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다듬어진 시대사조와 체제들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다수의 한시적 규합을 위해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수용’을 명분으로 기준과 원칙 없이 생산되는 감각적 대중문화를 이용한다. 대부분 소속감 없는 구성원들에게 막연한 연대감과 집단적 의존성이 스며진 문화를 공급하는 전략을 공유하고 모방한다. 여기서 의존성이 생긴 대중 또는 집단에 대한 거동제어의 효율과 효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때마침 등장해 준 인터넷 기술과 SNS의 편의성이 일등공신이었다.
언론인도 아니었고 위정자도 아니었지만, 수천 년 전을 살았던 공자(孔子 B.C. 551~479)가 “…괴이(怪異), 용력(勇力), 반란(叛亂), 귀신(鬼神)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子不語怪力亂神)고 전해오는 논어(論語)의 술이(述而)편에서 인간모듬살이 속에서 깨우친 세월을 초월하는 선현의 지혜가 놀랍다.
프랑스 소르본대학과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베트남의 선사(禪師)이자 평화운동가인 틱 낫한(Thich Nhat Hanh 1926~2022)은 불구대천 원한관계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가 만든 프랑스 ‘플럼빌리지’에 초청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했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처음엔 과거의 증오, 분노, 고뇌, 의심 등으로 서로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지만, 숨쉬기와 걷기, 명상을 통해 육체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기간과 그 이후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민의 경청과 애정 어린 대화로 서로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이끌며 소통의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그들을 놀랍고 신기한 행사나 요란스러운 이벤트를 통해 얼렁뚱땅 대충 하나로 버무려 섞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담담하고 차분한 일상 속에서 소통의 답을 찾으려 했던 것 또한 공자의 태도와 나란히 두어 눈여겨볼 일이다.
담담하고 차분한 일상이라는 화두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 2021년 11월, 스페인의 여류산악인인 베아트리세 플라미니가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하 70m의 동굴에 내려가 홀로 500여 일을 지내고 동굴 밖으로 나오던 2023년 4월 어느 날, 매스컴의 플래시 세례 후 조용히 밝힌 성공의 소회(所懷)에서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들에 집중하고, 매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그 시간들을 견뎌낸 비결이었다. 아울러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었다”고 했는데, 그 500여 일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가 매일 전해 듣는 수많은 괴력난신(怪力亂神) 류의 이야기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들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행복을 주었다고 회고했다.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대한 관심과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정신을 가진다고 하였다. 나 자신의 내부를 향한 도를 넘는 관심과 집중은 병적 현상이고, 외부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과 집중도 허망하다는 뜻이리라. 베아트리세의 500일간의 경험에서는 내부를 향한 집중에서 거둘 수 있는 행복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고, 공자나 틱 낫한이 전하는 메시지에서는 외부를 향한 소통의 마음가짐과 정제된 언어사용의 중요함을 절감한다.
내부가 건강해야 외부에 대한 소통도 조화로울 터, 나의 내부에 대한 살핌과 더불어 외부에 대한 조심스러운 소통, 즉 정제된 말과 그것의 힘에 대한 깨달음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해야 할 숙제다.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도 ‘죽음과 삶은 혀의 힘 안에 있다’고 했다. 우리가 깊은 사유 없이 내뱉는 엄청난 말들은 일상의 시간 속에서 반복되고 전달되며, 문화가 되고 어느새 사상이 되어 결국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나아가 우리의 자손에게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