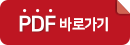꽤 오래 전 혼자 떠나는 여행을 좋아하던 시절, 토함산 일출을 보러 올랐다 만난 스님이 있었다. 이른 새벽 인적도 없는 길을 함께하며 우리는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로 짧은 시간동안 벗이 돼 버렸다. 결국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선방에 기거하며 하루 한 끼 오후 식사만 하는 그 분이 망설임 없이 경내 식당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헤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다가온 늦은 깨달음은 꽤 충격이었다. 만약 그 분이 아침 식사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원칙만을 지켰다면 나는 아마 스님 앞에서 홀로 어색한 식사를 했거나 주린 배를 안고 동네로 내려왔을 것이다.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스스로의 금기를 깨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없이 내 식사에 동참해준 그 분이야 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원칙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준 큰 멘토였음은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칙이란 것은 만들기는 쉽지만 지키기가 더욱 어렵고, 일단 잣대에 걸려들면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졌다. 그래서 구약성서 율법처럼 누구든 쉽게 옭아매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아예 망나니 동물처럼 스스로의 생을 무원칙으로 가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에게 규칙과 인간 존중의 바탕이 되는 규범으로써 가치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해석의 근본이 빈틈의 여지없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원칙이 아니라 죽이는 판결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신이 그토록 비루하다면 굳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사의 어리석은 원칙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비극의 사건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의 정신이 왜 필요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작금의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굳건히 인권이 보호되고, 평등과 문명이라는 대중적 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된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웹 기반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인간의 정서와 문화에 공유하는 기록적인 공감대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 정신의 새로운 각성이라는 신인류로서의 르네상스를 개벽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이것은 인류가 금기로 치부했던 원칙까지 새롭게 해석하며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돼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니체가 추구했던 초인 정신으로의 진보일 수도 있다. 무거운 짐을 진 낙타가 드디어 활개를 치는 사자가 되고, 다 자란 성인이 언젠가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낙관적 변화를 기대하게도 한다.
우리 치과계에도 오랜 원칙들이 잘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자의든 타의든 그 룰을 지켰지만 언제부턴가 금기가 원칙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원칙이 없는 탓에 수습은커녕 우리의 룰이 아닌 국가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꼴이 됐다.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 가끔은 금기도 애교가 돼 원칙의 포용성을 시험할 수 있을텐데, 이도 저도 안 되게 무너진 우리의 현실을 누가 나서서 수습할 수 있을지. 아마도 우리들의 각성 없이는 요원할 것이다.